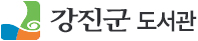매년 장애인의 날은 365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돌아온다.
정부와 언론은 아주 잠깐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우리 사회가 가야할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 한다. ㅇㅇㅇ한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 등 오피니언, 사설 등으로 장식된 지면 몇 장은 장애인의 날이 지나면 또 그렇게 잊혀진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
이 책은 ‘안전’과 ‘보호’라는 두꺼운 유리막을 거둬내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사유하자는 제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편협한 사고와 결별하고 그들 역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주체임을 깨닫는 일이다.
복지 제도나 서비스의 방향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면, 바로 이런 관점을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비장애인의 삶에도 가닿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한쪽이 도움을 베풀고 다른 쪽은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관계가 잘 보여주듯이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것과 ‘타인’을 돌보는 것을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이 지적 여정의 동반자 ‘푸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