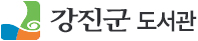반 뼘들을 위로하는 둥근 시선
-꿈결에 시를 베다/ 저자 손세실리아/실천문학사 출판/2017
우리들 서평단 김미진
‘무수한 복병에도 불구하고 섬을 뜨지 못했던 건 인간들로부터 버려지고 내쳐진 오두막의 처연한 눈빛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해야 사철 꽃 지는 일 없게 마당을 가꾼다거나, 가만가만 말 걸어주고 칭찬해주는 따위가 전부였을 뿐, 허나 진심이 읽혀졌던 걸까? 그는 눈 먼 보리 숭어의 비상과 화염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장엄한 놀을 앞마당에 펼쳐주었다. 분에 넘치는 포상이다.
사는 일이 매양 이러하다. 어눌하고 촌스럽고 거절에 서툴러 궂은일을 자초하기도 한다. 오지랖이 넓어 아프고 고달프고 사무치고 아련하다. 시가 나를 향해 제 발로 찾아와준 건 어쩌면 이런 못난 구석이 눈에 밟혀서 일게다. 혼자 놔둘 수 없게 위태로워 손 내밀어 준 것일 게다.’라고 제주도에 안착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들고나오는 시인이 참 다정하다. 시인이 시를 전개하는 방식이 이야기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 실린 시는 그러한 시인의 눈으로 관찰되고 그려진 것들로서, 힘없고 낡고 외로운 편에 서 있는 대상을 감싸고 온전하게 둥글리는 힘이 있다. 절룩이는 주인의 등을 잘린 발로 절뚝이며 뒤따르는 <반려견>의 이미지 포착은 시인의 따뜻하나 번뜩이는 채집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 중 하나이다.
그의 시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어머니, 가족, 소외된 이웃,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고달프고 힘겨운 삶의 풍경들이 녹아 있다. 시인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해 슬퍼하고 있을 존재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구수하게 곰삭은 시상을 통해 “온 뼘”이 되지 못한 “반 뼘”들을 위안하는 법을 설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