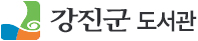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남진우는 김 훈 작가를 일러 '문장가라는 예스러운 명칭이 어색하지 않은 우리 세대의 몇 안되는 글쟁이 중의 하나'라고 평하고 있기도 하다.
연필이란 얼마나 단단하고 뾰족한가....그러나 때로는 단단해 보이는 내면에 무름이 있어 흰 종이에 자신을 녹여내어 글자를 완성해 나간다. 작가 자신이 마치 이 연필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작가가 언어로 붙잡고자 하는 세상과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선상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는 선원들이기도 하고,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있는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민망하게도 혹은 선정주의의 혐의를 지울 수 없게도 미인의 기준이기도 하다.
그는 현미경처럼 자신과 바깥 사물들을 관찰하고 이를 언어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며, 무엇보다도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하면서 변화하는 자신의 몸과 느낌을 메타적으로 보고 언어로 표현해낸다.
신문 기사처럼 건조하고 날카롭고 자잘하고 세밀하고 감동적이고 보잘 것 없기도 한 삶의 이면을 향한 작가의 무르고 따뜻한 감성을 함께 읽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