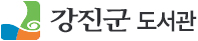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서평] 소요하는 자의 느리고 은연한 시선
강진군도서관 우리들 서평단 _ 김미진
시인은 1966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199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력 30년 차 중견 작가이다. 시집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련다』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등 다수를 상재, 현대시학작품상, 소월시문학상, 육사시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출판사 인터뷰에서 "자전거 타고 국토 종주하다가 불현듯 고향의 빈집에 가보고 싶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다 보면 낯선 길이나 사물, 작은 동물들과 만나게 되고 어떤 기억이나 상상이 일체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되풀이되는 행동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는 갈망이나 그리움, 그런 실제 풍경과 체험이 하나가 되는 방식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듯, 시인은 '해질녘과 밤이 오는 사이'에 천변, 강둑을 걸으며 '서성거림과 강물 사이' 사물들의 미세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 사유하는 철학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걷다 보면, 그리하여 나는 손바닥도 발바닥도 없이 물 위에서 투명한 생각으로 흘러가 내 삶이 한 장소와 한 풍경으로 축소되어...' (「동네 천변을 매일」)
'보의 난간을 뛰어넘으려고 지느러미가 파닥거릴 때마다 물고기 배에 피멍이 드는 환영이 내 눈에 찍히고 있었다... 새벽에 빛으로 가득한 상류에 알을 낳는 건지, 나는 그들의 밤 유영에서 영원을 보았다...' (「불광천」)
'장마철은 끝나고/ 선착장은 진흙탕이 되고/ 오리 두 마리도 사라지고 없을 때/ 새벽의 그 시간/ 나는 구두가 진흙 범벅이 된 채로/ 경사 맨 끝 오리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보았네/ 저 먼 데/ 오리 두 마리가 몸을 꼭 붙이고 바라보던 밤/ 강물의 페이지를 넘겨 보았네' (「밤의 선착장」) 등의 시들은 그 좋은 예이다.
강가나 길을 소요하면서 '사물에게도 잠자는 말이 있다/ 그 말을 건드리는 마술이 어디에/ 분명히 있을 텐데/ 사물마다 숨어있는 달을/ 꺼낼 수 있을 텐데...(「달나라의 돌」)' 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시인은, 마치 라깡이 말하는 무의식의 기표의 세계를 아는 듯하다. 발화되기 전 우리 무의식에 언어체계로서 존재하는 것 - 사과라고 부르기 전 사과는 이미 거기 있다는 사유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마음속에서만 사는 말들을 꺼내주는/따뜻한 손'(「이 봄의 평안함」)과 '내 안에 쓸쓸하게 살다 간 말들을 받쳐줄/부드러운 손'(「은하」)이 되고자 한다.
특히 사물에 대한 미시적이고 사소한 예감을 '표현할 수 없는 슬픈 소리'(「튤립밭」)로 '슬픔도 환할 수 있다는 걸'(「저녁나절」) 보여주는 시인은 '꽃에서도 테두리를 보고/달에서도 테두리를 보는.../ 슬퍼하는 상처가 있어야 위로의 노래도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통로를 열겠지'(「테두리」)라는 따뜻함으로 삶을 수용하고 있다. 상처 더미인 내면을 성찰하고 따뜻하게 주변 사물과 화해하는 기술이 그의 시 세계에 깃들어 있으니 이 한 권의 시집을 통해 더운 여름밤 주변의 미세한 존재의 기척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출판사 인터뷰에서 "자전거 타고 국토 종주하다가 불현듯 고향의 빈집에 가보고 싶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다 보면 낯선 길이나 사물, 작은 동물들과 만나게 되고 어떤 기억이나 상상이 일체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되풀이되는 행동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는 갈망이나 그리움, 그런 실제 풍경과 체험이 하나가 되는 방식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듯, 시인은 '해질녘과 밤이 오는 사이'에 천변, 강둑을 걸으며 '서성거림과 강물 사이' 사물들의 미세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 사유하는 철학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걷다 보면, 그리하여 나는 손바닥도 발바닥도 없이 물 위에서 투명한 생각으로 흘러가 내 삶이 한 장소와 한 풍경으로 축소되어...' (「동네 천변을 매일」)
'보의 난간을 뛰어넘으려고 지느러미가 파닥거릴 때마다 물고기 배에 피멍이 드는 환영이 내 눈에 찍히고 있었다... 새벽에 빛으로 가득한 상류에 알을 낳는 건지, 나는 그들의 밤 유영에서 영원을 보았다...' (「불광천」)
'장마철은 끝나고/ 선착장은 진흙탕이 되고/ 오리 두 마리도 사라지고 없을 때/ 새벽의 그 시간/ 나는 구두가 진흙 범벅이 된 채로/ 경사 맨 끝 오리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보았네/ 저 먼 데/ 오리 두 마리가 몸을 꼭 붙이고 바라보던 밤/ 강물의 페이지를 넘겨 보았네' (「밤의 선착장」) 등의 시들은 그 좋은 예이다.
강가나 길을 소요하면서 '사물에게도 잠자는 말이 있다/ 그 말을 건드리는 마술이 어디에/ 분명히 있을 텐데/ 사물마다 숨어있는 달을/ 꺼낼 수 있을 텐데...(「달나라의 돌」)' 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시인은, 마치 라깡이 말하는 무의식의 기표의 세계를 아는 듯하다. 발화되기 전 우리 무의식에 언어체계로서 존재하는 것 - 사과라고 부르기 전 사과는 이미 거기 있다는 사유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마음속에서만 사는 말들을 꺼내주는/따뜻한 손'(「이 봄의 평안함」)과 '내 안에 쓸쓸하게 살다 간 말들을 받쳐줄/부드러운 손'(「은하」)이 되고자 한다.
특히 사물에 대한 미시적이고 사소한 예감을 '표현할 수 없는 슬픈 소리'(「튤립밭」)로 '슬픔도 환할 수 있다는 걸'(「저녁나절」) 보여주는 시인은 '꽃에서도 테두리를 보고/달에서도 테두리를 보는.../ 슬퍼하는 상처가 있어야 위로의 노래도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통로를 열겠지'(「테두리」)라는 따뜻함으로 삶을 수용하고 있다. 상처 더미인 내면을 성찰하고 따뜻하게 주변 사물과 화해하는 기술이 그의 시 세계에 깃들어 있으니 이 한 권의 시집을 통해 더운 여름밤 주변의 미세한 존재의 기척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