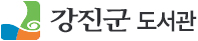아버지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은 "엄마"보다는 친근감도 덜하고 거리감마저 느껴진다.
이 책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이 책속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책임감이 있고
벽 한 쪽에 자식들의 대학 졸업사진을 걸어두는 등 여러 면에서 자상한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아버지의 바람을 끝내 이뤄드리지 못한 여주의 모습이 조금 아쉽게 비춰지기도 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내가 겪은 나의 아버지와 비교되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둔 소설 속의 주인공이 부럽기도 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간 동안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몇 년만에 아버지를 향해 가는 주인공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리라.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기억하고 챙겨주는 아버지의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아버지와 지내는 짧은 기간 동안 저자가 잘못 알았던 아버지의 삶과 생각을 접하는 순간, 저자는 아버지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
"나는 아버지를 한번도 개별적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도 그게야 깨달았다.
아버지를 농부로, 전쟁을 겪은 세대로, 소를 기르는 사람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버릇이 들어서
아버지 개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게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p 197)
"나는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번이라도 노력한 적이 있었던가?
먼 이국의 사람들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말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아버지 뇌만 기억하도록 두었구나, 싶은 자각이들었다.
말수가 적은 아버지라고 해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딸이 되어주었으면 수면장애 같은 것은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