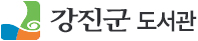지금 이 순간에도 가짜 뉴스는 당신을 노리고 있다!
- S. I -
움베르트 에코. 그의 마지막 소설 『제0호』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올바른 저널리즘>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공정성을 잃은 보도와 음모론적 역설의 난장, 뚜렷한 방향 없는 단발마의 포르노적 정보 공세, 일찍이 『푸코의 진자』, 『프라하의 묘지』 등에서 다뤘듯 음모론을 둘러싼 대중의 망상에 오랜 시간 흥미를 가져온 에코는 저널리즘의 편집증을 목록화해 펼쳐 보인다. 때는 1992년, 실제 이탈리아에서 전무후무한 정치 스캔들이 터지며 대대적인 부패 청산의 물결이 일던 시기이다.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무장한 세력가를 배후에 둔 어느 신문사의 편집부가 주 무대로, 무솔리니의 죽음을 둘러싼 황색 언론의 행태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CIA, 정치가, 테러리스트, 마피아, 프리메이슨, 교황까지 얽혀든 음모는 끝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다. 이로써 사회 저변에 침투하는 매스 미디어의 광포한 영향력을 곱씹게 한다. 그러나 에코는 특유의 해학을 버무리고, 혼란한 바깥 사정과 별개로 새롭게 뿌리 내리는 인간 사이의 애정과 연대를 제시한다. 이전의 그 어느 작품보다도 단순명료한 문체와 구성은 오롯이 대중을 향한 것으로 큰 울림을 전한다.
“제0호는 창간 전의 예비 판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널리즘의 본보기, 신문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몇 달 전 폭탄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경우, 우리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독자들은 아직 모른다고 치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밀을 유출하듯이 전하는 정보들은 참신하고 놀라운 양상을 띨 것이고, 심지어는 예언적인 품격까지 보일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을 맡긴 출자인에게 보여 주어야 해요. 만약 『도마니』가 어제 나왔다면 우리는 이런 기사를 이렇게 실었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탄 테러가 정말 일어나야만 제0호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폭탄을 던진 적이 없다 해도,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제0호를 만들 수 있어요.”(P50)
“나는 황혼녘이면 그늘진 얼굴로 어두워지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에 반짝이는 산 줄리오섬은 마치 뵈클린이 그린 「망자의 섬」처럼 물에서 솟아오른 듯했다. 마이아는 산책을 하자며 나를 오르타의 사크로 몬테로 데려갔다. 언덕에 여러 채의 예배당이 올라서 있고, 실물 크기의 채색 조각상들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디오라마가 펼쳐진다. 웃는 천사들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성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실체처럼 형상화한 무대가 많다. 고통 받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조각상에서 나는 유감스럽게도 언젠가 벌어진 테러 공격의 희생자들을 보았다. 교황이 여러 추기경이며 카푸치니 수도사들을 만나는 엄숙한 모임을 형상화한 무대에서는 나를 체포할 바티칸 은행의 회의를 보는 기분이 들었다. 갖가지 색채며 경건한 테라 코타 조각상들을 보면 하늘의 왕국이 생각날 법한데,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모든 게 그늘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악한 세력의 교묘히 위장된 알레고리처럼 보였다. 나는 산 베르나르디노 유골 성당에서 본 해골들을 떠올렸다. 여기 사크로 몬테의 조각상들이 밤에 해골로 변하여 그 유골 성당의 뼈들과 함께 죽음의 무도를 추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기까지 했다.(결국 이곳 천사의 분홍빛 육신은 아무리 천상의 것이라 해도 속에 뼈를 감추고 있는 헛된 외관이 아니겠는가?)”(P300)
삶은 견딜만 하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 된다.
스칼렛 오하라가 말한 대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산 줄리오섬은 햇살에 다시 빛날 것이다.(P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