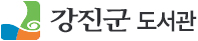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분투
- S. I -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병원으로 오는 환자 이송 시간 평균 245분, 생명을 살리는 골든아워 60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쳐지고 있다.
피는 도로 위에 뿌려져 스몄다. 구조구급대가 아무리 빨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도 환자는 살지 못했다. 환자의 상태를 판단할 기준은 헐거웠고, 적합한 병원에 대한 정보는 미약했다. 환자는 때로 가야 할 곳을 두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옮겨졌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기다렸다. 그 후에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옮겨지다 무의미한 침상에서 목숨이 사그라들었다. 그 사이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나갔다. 선진국 기준으로 모두 ‘예방 가능한 사망’이었다.
내 환자들이 숨을 거둘 때 살이 베어나가듯 쓰렸고, 보호자들의 울음은 귓가에 잔향처럼 남았다. 죽음과 눈물이 일상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손끝에서 죽어간 환자들의 수를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짓을 그만두었다.
‘외상(外傷)’이 몸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에 의해 손상된 모든 것을 의미할 때, ‘중증(重症)외상’은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외상으로 반드시 ‘수술적 치료’ 및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어딘가에 부딪히고 깔리거나 떨어져서 혹은 무엇인가에 관통당해 사지와 뼈들이 으스러지고 장기가 터져나가는 경우들이다. 이때 환자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헬리콥터를 이용해서라도 이송은 신속해야 하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도달해야 한다. 도착과 동시에 빠른 진단, 수술, 집중치료가 이어져야 하므로 수술방과 중환자실이 받쳐줘야 한다. 마취과부터 혈액은행, 의료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의료 지원도 신속히 투입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중증외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 원칙’이다.
의사자격시험을 볼 때 90퍼센트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는 기본적인 외상환자 치료 원칙은 현장에서 뒤틀렸다. 졸업 후 현장에서 임상 근무가 시작되면, 이 원칙은 곧 뇌리에서 사라진다. 수술할 의사는 없고 마취과 의사와 수술방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중환자실 자리는 언제나 부족했다. 환자들은 응급실과 응급실 사이를 떠돌다 길바닥에서 예정에 없던 죽음으로 들어섰다.
살려야 했으나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필요한 것은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아서 더 알 수 없었다.
같이 일할 전공의들 없이 임상실습생들과 수술 현장에 서야 하는 내 상황은 끊임없이 불안했다. 개별 환자의 치료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업무 형태로는 ‘지속가능성’이 없었다. 하던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내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대부분이 몸 쓰는 일을 했고 몸을 쓰다 깊이 다쳐 죽다 살아났으나, 이전만큼 몸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목숨은 건졌으나 더는 공사장 인부로 밥벌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P66)
“그의 목숨을 붙들고 있는 인공호흡기와 인공신장기를 보며, 그것들이 요구하는 ‘돈’을 생각했다. 이것들은 선진국에서만 생산되는 ‘몹시 비싼’ 첨단 의료기기이고, 제대로 국산화되지 못해 일분일초마다 돈을 먹는 기계였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으면 환자는 수술을 받아도 살지 못한다. 가난한 그들이 치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난한 내 부서로 적자가 되어 떨어져 내려왔다.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상황에서 결국 녹아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나와, 그런 나에게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이다.”(P67)
『골든아워1』는 생과 사의 경계, 2002~2013년 동안의 중증외상센터의 기록이다. 이국종교수가 이끄는 아주대학교 외상외과 의료팀들이 병원관계자나 정부의 지원도 없이 힘겹게 환자를 살려내는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