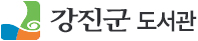강진군도서관 우리들 서평단 _ 강현옥
마치 보도기사 같은 소설, 핏줄과 시절의 늪을 건너다 죽었거나 죽어간, 무고(無告)하거나 무구(無垢)한 아버지들의 이야기, 온 감각을 통째로 흔드는 문장을 만났다. 사실 나는 이야기 속으로 진입하지 못했고, 행간과 행간사이의 의미를 건너 띄었으며, 오직 문장이 품어내는 향기에 집착하였다.
다만, 대하장편소설로 풀어야 할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 짓고 허덕지덕 달아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궁금했다. 수다를 떨지 말아야 한다고 늘 다짐했기 때문일까 하고.
마을마다 공터가 있었다. 대개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어른들은 장기를 두거나, 아이들은 지치도록 놀았다. 그 곳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었으나 누구도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다. 달아날 수도 살수도 없는 공터 같은 터전에서, 남루하고 신산한 삶을 살아낸 우리의 삼부자는 고난의 20세기(1920-1980)를 직조해나갔다. 마동수, 마장세, 마차세가 살아낸 삶속에는 비굴과 비애, 서글픔, 서슬 퍼런 독기, 집착과 아집, 연민과 온기, 소외와 소멸이 뒤섞여 있어서 몹시 어지럽고 아찔했다.
평생을 밖으로 떠돌다 몇 개월에 한번 씩 기어들어오는 아버지, 치매와 선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거점을 잃고 가족의 경계선에서 멀어져간 형과는 달리 마차세는,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해냈다. 그는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결코 해석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남은 삶을 돌보았고 그 마지막을 정리했다. 엄살 없는 마차세와 달리 나는 소설 밖에서 혼자 힘이 들었다.
그의 피붙이의 말들은 여름날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힘을 빼냈다. "미안하다." "니가 힘들겠구나." "길녀야 길녀야, 어딨니? 길녀야."그들의 대사는 슬프도록 끈끈했다.
소설을 읽는 내내 불편했다. 무겁고 암울하고 서글펐다. 내가 잇고 있는 이 세상도 흡사 전쟁터 같아서 헛헛한 가슴을 얼음으로 채운 기분이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터전을'공터'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공터에 묶여져 고개를 푹 숙인 비루한 조랑말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작가는 인터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겨우 조금씩 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딛고 있는 토대에 두 발을 딛고 앞을 직시하며 살아내겠다는 마차세의 강한 의지와 닮아서 놀랐다. 혹시, 그가 그인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