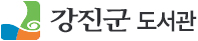“나는 몇 인용짜리 사람일까”
- S. I -
내 이름 앞에 인용이 붙는다면 어떤 숫자가 어울릴까. 나는 무엇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려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다. 얕은 잠을 자다가 엄마가 뒤척이는 소리에 깼는데 언제부터였는지 엄마는 내가 들을세라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그런 기분도 있다는 걸 남몰래 우는 엄마를 통해 여실히 배운 날이었다.
혼자서 영화관에 자주 가곤 했다. 그때 본 영화는 이별에 관한 이야기여서 슬픈 장면이 많았는데 하필 내가 가장 마음 아파하던 장면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같은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와 전혀 다른 기분을 가진다면 결국 모든 기분은 1인용이 아닐까.
서른이 되면 삶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내 일상은 평소와 차이가 없다. 그래도 한창때가 지났다는 생각이 한숨처럼 달라붙는다. 푸르른 봄날을 뜻하는 청춘도 나이로 구분되진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단어로 콕 집어 설명할 수 없는 1인용 기분.
어릴 때 학습된 가난은 엄격하다. 그래서 오지 않은 불행까지 준비하게 된다. 노력에만 기대기에는 밤하늘이 너무 넓고 깊어서 오늘만큼은 요행을 바라고픈 기분. 그리고 1인용 소원.
집 열쇠를 예쁜 것으로 고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열쇠에 거는 키링은 다들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예쁜 것으로 고르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 열쇠를 보며 예쁘다고 웃을 일은 없지만 열쇠고리를 보며 예쁘다고 웃을 일은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순간들, ‘잘’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도 내게는 이런 키링 같은 것이었다. 화분에 물을 주는 일, 굳은 손 편지를 쓰는 일, 혼자여도 예쁘게 차려놓고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일.
나는 믿는다. 예쁜 쓰레기들이 가끔은 나를 버티게 한다고.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게 꼭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P99)